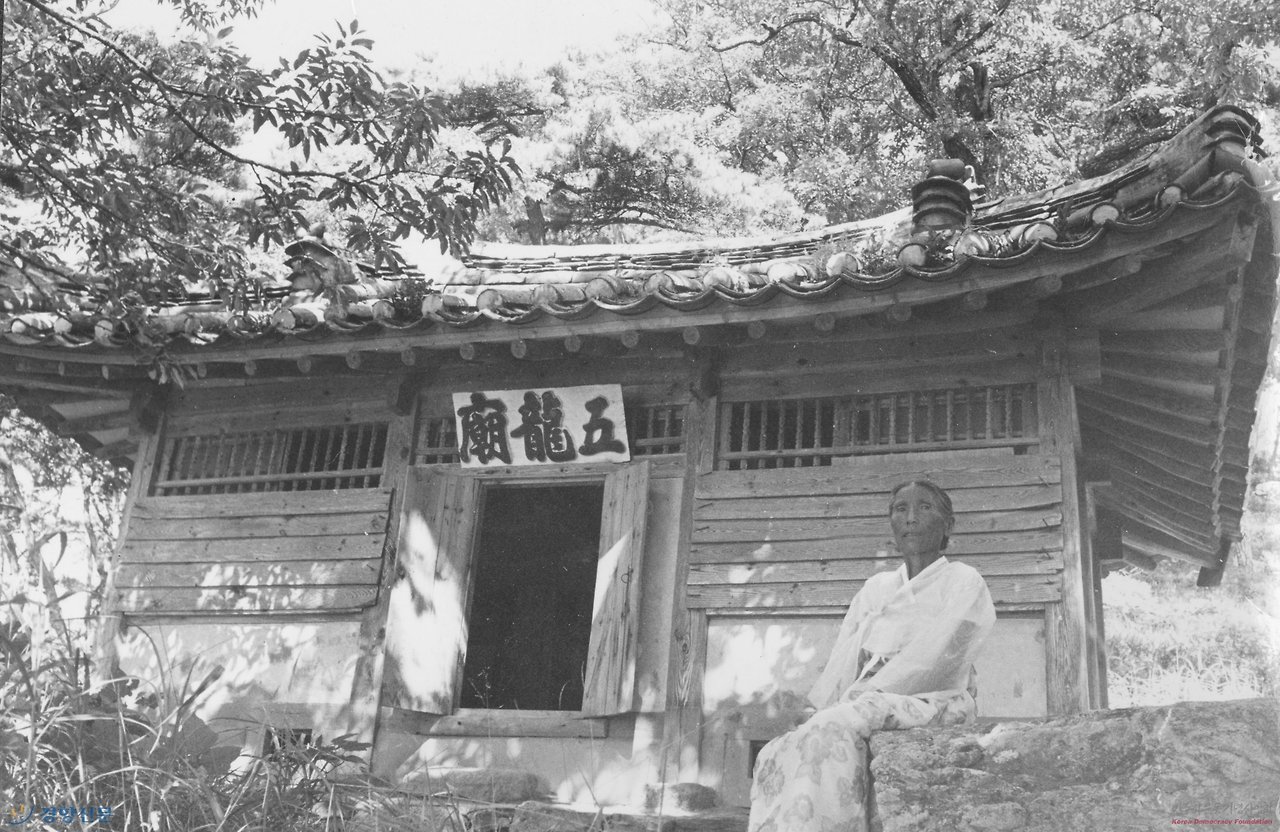조선 선조 때의 호남가단의 시인 가운데 백미(白眉)로 치는 임제(林悌, 1549년 음력 11월 20일 ~ 1587년 음력 8월 11일)의 이야기이다.많은 일화를 남긴 일대의 문재(文才)요, 기재(奇才)인 백호(白湖) 임제(林悌=예조정랑·湖堂호당)다.그는 박상(朴祥), 임억령(林億齡), 임형수(林亨秀), 김인후(金麟厚), 양응정(梁應鼎), 박순(朴淳),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고경명(髙敬命) 등 호남파(湖南派) 시인 가운데 백미(白眉)로 친다. 十五越溪女 / 십오월계녀 /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羞人無語別 / 수인무어별 / 남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졌네歸來掩重門 / 귀래엄중문 / 돌아와 겹문을 꼭꼭 닫아걸고는泣向梨花月 / 읍향이화월 / 배꽃 같은 달을 향하여 흐느끼네. 이 유명한 "무어별(無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