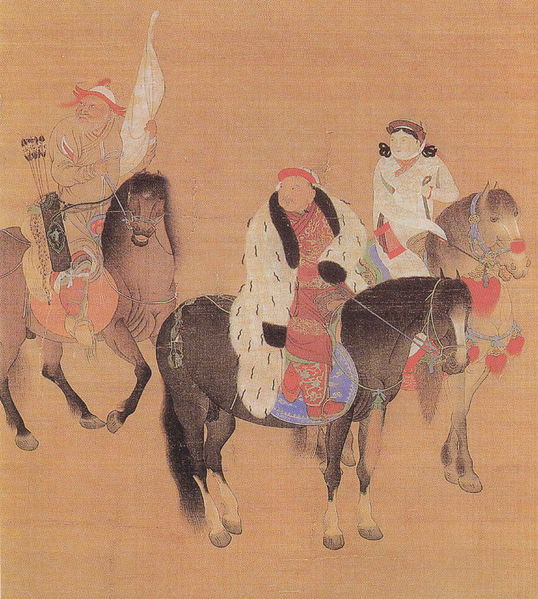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갯속에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 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그러나 서두르지 않은 추적으로,침착한 보조로,유유한 속도로, 위엄 있는 긴박성으로,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 그리고 발보다더 급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나는 도망자처럼 애걸했습니다.빠알간 커튼 드리워진, 사랑들이 격자무늬 창살처럼 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