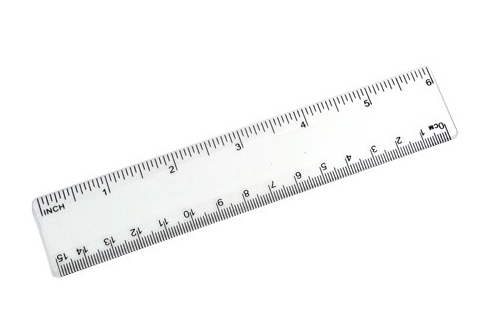자기 자신. 흔히 '나'는 자아 발견에 따르는 자기부정이나 자기혐오에 대한 시적 대상이 된다. 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는 존재의 자기규정이 어려운 만큼 주로 구름, 바람, 새, 나무, 이슬, 바위, 거울 등의 형상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 자화상.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님의 침묵", p. 28) 광막한 우주 안에 좁쌀알보다, 작게 떠 있는 지구보다도 억조 광년의 별빛을 넘은 허막(虛漠)의 바다에 충만해 있는 에테르보다도 그 충만이 주는 구유(具有)보다도 그 반대의 허무(虛無)보다도 미지(未知)의 죽..